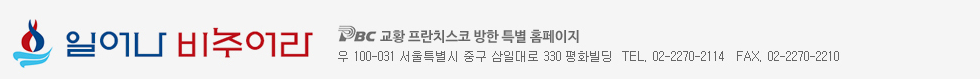[평화칼럼] ‘같은 곳’ 바라보기
 |
| ▲ |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요?”
평화방송이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화 「그 사람 추기경」(8월 7일 개봉)은 김수환 추기경 자신이 던진 질문으로 시작된다. 영화는 추기경의 선종 전 1000일을 담아낸 영상기록이다. 스크린 속에서 추기경은 거듭 묻는다.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고. 질문의 진의와 상관없이 오랜 세월 그에게 빚졌던 교회 언론 종사자로서 추기경의 물음에 답하는 일은 심란하다.
나는 추기경을 어떻게 보았던가? 나의 카메라는 추기경의 얼굴만을 마주 보았던가? 아니면 추기경이 바라보는 쪽을 같이 바라봤던가?
1980년대 철권통치 시절, 명동성당에 피신한 학생들을 체포하러 온 경찰특공대에게 추기경은 일갈했다. “나를 밟고 지나가야 학생들을 만날 것이다.” 여러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이 말씀을 ‘추억의 명대사’처럼 반복해댔지만, 정작 추기경이 꿈꿨던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받는 세상’에 대해 내가 만든 영상들은 과연 얼마나 진지했던가? 성매매 여성들을 찾아 위로했던 추기경을 거리의 성자처럼 묘사하면서도 이 땅의 딸들이 육신을 망가뜨려야 하는 현실에 관해선 말을 아끼지 않았던가. 적어도 나는 그랬고, 그러기에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는 당신의 물음 앞에 제 발이 저리다. “가난한 사람들과 너무 멀리 있었다”고 한탄하는 추기경의 말씀에 울컥하면서도 그가 진정 사랑한 사람들을 제대로 클로즈업하지 못한 ‘안일(安逸)’이 뒤늦게 후회막급이다. 스스로 세상의 ‘밥’이 되고자 했던 혜화동 할아버지에게 할 말이 없다.
이제 곧 프란치스코 교황과 만난다. 간절히 원하건대 똑같은 이유로 교황에게 부끄럽고 싶지 않다. 교황의 드높은 인기에 취해 그의 진짜 메시지를, 그의 눈길이 실제로 머무는 곳을 놓칠까 두렵다. 김 추기경에게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다시 한 번 교황의 행보를 미리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는다.
아시아청년대회에서 젊은이들과 어깨동무한 교황에게 환호하기보다 그의 곁에 운집한 청년 그리스도들의 모습을 최선을 다해 카메라에 담아내는 일이 먼저여야 하겠다. 그들이야말로 교황이 희망을 거는 아시아 선교의 사도들이자 교회의 미래인 까닭이다.
대전에서 거행되는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에 세월호 유족들을 초대한 교황에게 감사할 게 아니라, 교황의 위로에도 치유되지 않는 깊은 슬픔들에 관해 더 많이 이야기해야 한다. 그것이 교황이 우리와 함께 짊어지고자 하는 고통의 십자가이기 때문이다.
광화문에서 하느님의 종 124위의 시복을 선포하는 교황의 목소리 못지않게 순교신심의 계승을 다짐하는 우리들 묵주기도의 볼륨을 높여야겠다. 교황이 열망하는 새로운 복음화의 동력이 순교영성 안에 살아 숨 쉬는 이유다.
꽃동네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과 포옹하는 교황의 애틋한 표정 위로 빈곤의 원인을 냉철하게 간파한 그의 가르침들을 오버랩해야 한다. 세상의 모순을 바로잡기 위해 ‘기꺼이 상처 입고 더럽혀져야 할 교회의 소명(「복음의 기쁨」 49항 참조)’을 우선 일깨워야 하는 까닭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을 가장 훌륭하게 맞이하는 길은 그의 얼굴이 아닌, 그의 시선이 향하는 곳으로 우리의 눈을 맞추는 것이다. 인기 스타 ‘파파 프란치스코’의 이미지 너머로 교황의 진정한 바람을 읽어내는 것이다. 그래야 교황이 떠난 뒤 우리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야만 지구 반 바퀴를 돌아 우리에게 온 교황에게 부끄럽지 않다. 교회 언론이 ‘그 길’을 열어갈 수 있길 간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