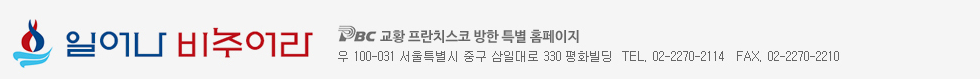[시사진단] 희망의 세례
이정옥 비비안나(대구가톨릭대 교수, 사회학)
 |
| ▲ |
화진포 동북단의 끝자락 바닷가에서 맛본 성게는 싱싱했다. 서슬 퍼런 가시껍질 속에 숨겨 있던 노오란 속살은 껍질과 대비를 이루어서 그 향기와 맛의 여운이 컸다. 걷히다 만 철조망 가운데 드러나는 해변의 아름다움, 성게를 써는 아주머니의 푸짐한 인심이 살벌한 전쟁의 기운을 평화의 기운으로 바꾸는 것처럼 느꼈다.
살벌한 전쟁의 기운을 평화의 기운으로 바꾸는 것은 ‘희망’이다. 화진포를 오다가 우연히 마주친 진부령군 미술관에서는 이중섭 특별전이 열리고 있었다. 진부령에서 만난 이중섭 화백의 그림은 남달랐다. 화가 이중섭은 그 세대의 보통 한국 사람이 다 그랬듯이 가장 참혹한 국제 전쟁이었던 태평양 전쟁과 6ㆍ25를 생전에 두 번이나 겪었다. 전쟁 중에도 그는 소, 사과나무, 사람들을 그렸고 그의 그림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천진난만하고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다. 심지어 사과나무 같은 식물은 물론 소를 비롯한 여러 동물도 친근하고 다정하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화가는 자연과 인간 내면에 깊이 스며 있는 선의 실마리를 찾아내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은 것이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화가의 기운을 지금 이 시점에 진부령에서 만나니 감회와 느낌이 남달랐다.
세월호의 비극, 임 병장 사건, 윤 일병 사건 등이 우리 주변에 전쟁의 기운을 뿜어내고 있다. 냉전 속의 열전이라는 6·25가 ‘정전’으로 마무리됐지만 정전은 말 그대로 전쟁을 잠시 쉬는 상태이다. 그런 배경 때문인지 철조망이 걷히는 평화의 기운이 올라오다가도 틈만 나면 다시 전쟁의 기운이 기세를 부리는 것이 반복된다.
올해는 유독 ‘전쟁의 기운’이 기승을 부린다. 전쟁 상태란 집단적 가해와 집단적 폭력 뒤에 개인의 양심, 이성, 성찰이 실종되는 상황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세월호를 비롯한 사건들을 보도하는 언론에서 내뿜는 언어는 거칠고 선동적이다. 성찰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 평소의 상식으로 납득되지 않는 이 비극적 사건의 ‘묻지 마 폭력성’과 그 피해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게 하는 동력은 ‘희망’이다. 인간의 선의와 이성을 복원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믿음 때문에 그런 끈질긴 추적과 성찰이 가능한 것이다.
프랑스 역사학자인 페르낭 브로델은 정치적 사건은 파도의 포말과도 같다고 했다. 정치적 사건이 아무리 요란한 듯 보여도 인간의 사회적 삶의 궤적은 정치적 사건의 포말 밑 심층에서 유유히 그 틀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도 이중섭 화가처럼 제2차 세계대전의 한가운데서 인간 삶의 장기 지속적인 ‘구조’를 드러냄으로써 당대의 절망적 상황을 지나가는 소나기쯤으로 여기는 ‘낙관적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으로 버텨냈다. 마치 철조망만 약간 걷어내도 언제 그랬다는 듯이 평화의 기운을 뿜어내고 있는 동해 바다의 해수욕장과도 같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신다. 그분에게 가장 받고 싶은 것은 희망의 세례이다. 교황께서는 수만 명이 실종되는 엄혹한 아르헨티나의 군부 독재를 경험하셨다. 젊은 시절 부에노스아이레스 빈민가에서 사목활동을 하셨다. 겉으로 보기에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느님을 믿고 인간의 선함에 대해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그분이 이 시점에 우리에게 오심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이곳 한국 땅은 전쟁이 기운과 평화의 기운이 서로 샅바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은 형국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녔던 인간 마음의 선에 대한 낙관적인 희망의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때맞춘 교황의 방한이라는 축복의 의미를 되새길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