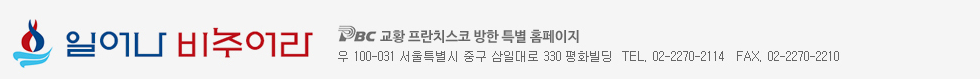|
양 냄새 풍기는 곳, 무료급식소 ‘토마스의 집’ 봉사자들
 |
| ▲ 16일 토마스의 집에서 봉사자들이 노숙인들에게 간식으로 줄 옥수수를 포장하고 있다. 옥수수는 강원도에서 한 후원자가 보내왔다.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토마스의 집’은 양 냄새가 난다. 가장 낮은 곳에서 다른 이들의 고통을 껴안는 이들의 향기가 토마스의 집을 가득 채운다.
“더 드시고 싶은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간식으로 옥수수 받아가세요!”
16일 점심시간에 찾아간 토마스의 집에는 봉사자 15명이 노숙인과 근처 판자촌 주민들에게 배식 봉사를 하고 있었다. 따뜻한 밥에 큼직한 두부가 들어간 된장국. 오징어 젓갈에 콩자반, 김치. 소박하지만 하나하나 정성이 담긴 음식이었다. 반찬은 잔반이 남지 않도록 하려고 일부러 적게 담고 모자라다는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더 주었다.
근무 중에 잠시 짬을 내서 왔다는 이현자(소피아, 58, 용산본당)씨는 반찬 통을 들고 다니며 부족한 사람의 식판에 정성스럽게 음식을 담아주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은 당연한 거잖아요. 몸이 성한 사람은 아픈 사람을 도와야죠. 오히려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봉사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삼성화재 서부지역단 봉사 리더를 맡고 있는 그는 토마스의 집에서 3년째 봉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그를 경계했던 노숙인들도 한결같은 그의 모습에 마음을 열었다.
“‘고맙다’, ‘잘 먹고 간다’는 말을 들을 때 가장 뿌듯해요. 그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인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는 거니까요.” 따뜻한 밥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을 줄 수 있어 행복하다는 그였다.
봉사가 마치 마약 같다는 김춘기(루도비코, 66, 목동본당)씨는 끊을 수 없는 봉사의 매력에 빠져 10년째 토마스의 집을 찾고 있다.
“하루 300~400명씩 밀려드는 사람들을 안내하고 식판을 들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어느새 근심과 걱정이 사라져요. 봉사할 때만큼은 마음이 맑아지는 것을 느끼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토마스의 집을 방문하지 않으면 꼭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처럼 이상하다는 김씨.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과 같은 위치에서 바라보는 자세를 가지게 됐다고 한다.
“이곳에 와서 단순히 식판을 나르고 설거지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상대방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바로 같은 입장에서 생각하고 마음을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 금방 지쳐버리고 맙니다.”
그의 말에는 가난한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가난한 이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아봐야 한다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메시지가 있었다.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는 말과 행동으로 다른 이들의 일상생활에 뛰어들어 그들과 거리를 좁히고, 기꺼이 자신을 낮추며, 다른 이들 안에서 고통받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몸을 어루만집니다”(「복음의 기쁨」24항).
오늘도 토마스의 집에는 양 냄새 나는 사람들이 모여든다. 가난한 이들을 먼저 선택하는 주님의 모습처럼, 가장 낮은 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길 잃은 양들을 돌본다.
김유리 기자 lucia@pbc.co.kr
|